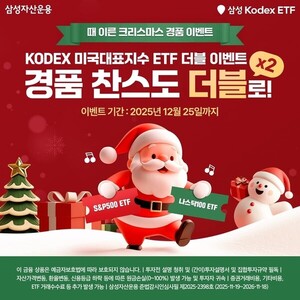기자 등 구속 송치...금감원 측 파악해 검찰 인계, 다시 지도받아 결과 수확
압수·수색만 50여곳 진행...증권가 주변 비리 적발 일부 언론인 행태 경종
금융감독원 조사국이 제보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진행,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중 일부는 기사를 가명이나 차명으로 보도하는 등 금융감독당국과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지만, 결국 덜미가 잡히면서 쇠고랑을 찼다.
24일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이번에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금감원 조사 건은 언론사 포함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한 대형사건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금융감독원]](https://cdn.financialpost.co.kr/news/photo/202511/238883_278632_5521.jpg)
금감원이 소속 특별사밥경찰의 역할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 측 역량을 보여준 사건이 부각돼 더욱 관심을 모은다. 일명 '인지수사권' 부재 상황이 부각되는 사건이라 한계를 극복하고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금감원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이다.
올해 3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본 사건을 보고받고, 금감원 특사경에 다시 수사지휘했으며, 금감원 특사경은 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포함 총 5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그 결과, 선행매매를 행한 전직 기자 A씨, A으로부터 기사를 전달받아 동일한 수법으로 선행매매를 한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 검찰에 송치했으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마무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직 기자 A씨는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 종목이나 미리 파악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특정 기업을 특징주로 부각하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 명의는 물론 배우자나 제삼자 명의를 이용해 다른 언론사로 유사 기사까지 송출하는 행위를 했다. 더욱이, 친분 있는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사전 공유받아 선행매매에 활용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현재 추산 111억원대 부정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 송치됐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부서와 별도로 부원장 직속으로 특사경팀을 운영한다. 그런데 당국이 검찰에 금융 관련 사건을 파악, 넘기면 검찰이 다시 금감원 특사경에 수사를 지시하는 순서로 일을 해왔다. 바꿔 말하면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더라도 검찰을 통해서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다. 시작 후 보고 등 일부 수사기관 관행은 금감원 특사경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찬진 신임 금감원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인지수사권' 부재로 규정, 금감원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달라는 요청을 정치권에 하고 나섰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개적으로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 및 금융위원회의 규정상 불명확한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견제 문제 등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다각화로 특사경 키우기 문제를 부각한다는 풀이가 나오며, 근래 금감원 특사경이 활약한 거액의 부정 케이스가 부각되면서 다시 이 문제가 조명될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기자들이 주축이 된 불공정 거래 사건과 관련해 일부 기자들은 경찰이나 금융당국 수사를 피하기 위해 가명 및 차명으로 기사를 쓴 점이 확인되면서, 언론계에 만연한 차명 및 가명 기사에 대한 조사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한 종합일간지 기자는 "특징주 기사를 통해 사익을 채운 기자들에 대해서는 동종업계 동료라고 하지만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들고, 언론계 신뢰마저 해친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런 일들이 비단 이들만의 문제는 아니며, (차명이나 가명을 쓰는) 이른바 '유령기자'를 통해 기업에 불리한 기사를 쓰고 이를 광고나 협찬으로 유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만큼 이에 대한 근절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